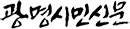내과, 안과, 한방병원...
여러 병원에서 처방해준 두툼한 약봉지를 꺼내서 버렸다. 의사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을 즐비하게 나열하기 일쑤였다. 그리고 죄인처럼 몸을 돌보지 못하고 산 생활을 지적하며 엄중한 경고를 했다. 여러 수치와 경계선을 가리키며 다른 환자의 극단적인 사례들로 불안을 심어줬다. 진료실에 있는 시간이 사형선고 시간처럼 무섭게 생각됐다. 삶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 들기도 했다. 약사에게 그 많은 약을 한꺼번에 먹어도 되는지 물었지만 약사들은 한결같이 의사의 처방을 따르라고 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론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만 들었다. 어딘가에 진실은 따로 있을 거라고. 그걸 찾아내야 한다고 하는 내면의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하던 일을 모두 중단 하고 시골로 내려와 버렸다. 누구나 한번쯤은 어둠이 뚜벅뚜벅 내게 걸어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분명 하나씩 따져보고 정리하려 했다면 나는 아직도 끙끙대며 약을 먹고 매일을 아픔과 경고 속에 그리고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 지낼 것이다. 그랬다면 의사가 내미는 나의 나쁜 수치들도 계속 높아졌을 것이다. 100% 위험한 일이 생길 거라고 위협하던 의사를 멀리 두고 떠나온 일은 정말 잘한 일이라 판단하고 있다. 서울에서 내려올 땐 나에게 갖가지 검사를 권하고 당장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얘기하던 의사를 무지 기분 나쁘게 여겼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덕분에 스스로 몸을 살리는 길을 찾게 된 계기가 되었으니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도 있다. 다만 나는 나의 방법으로 몸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중일뿐이다. 예약했던 병원과 검사들은 모두 취소했다.
사람도 일도 거리를 두니 마음도 편해졌다.
덕택에 살면서 처음으로 하는 일들이 많아졌다. 늘 할 일에 매달려 시간이 부족했던 생활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느리게 다른 곳을 보고 느끼며 지낸다. 해가 뜨는 일부터 날마다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는 일까지 조금씩 기온이 내려가고 달이 차는 것까지 모든 것을 보고 느낀다. 그리고 먹는 음식에도 정성을 다해 식사를 준비한다. 이곳에서 농부가 직접 생산한 갖가지 것들로 요리하는 법을 배워 식탁을 차린다. 언제 이렇게 긴 시간 몸을 챙겨 본 적이 있는가? 자신을 위해 정성껏 요리를 한 적이 있는가? 아침마다 벌레를 잡아 키우는 배추로 된장국도 끓이고 겉절이도 한다. 새로 캔 토란을 들깨 물을 받쳐 국을 끓이고 잎이 무성한 무를 뽑아 생채도 한다. 그 전의 나의 식사는 배만 고프지 않으면 되는 식이었다. 도시의 많은 사람들처럼 식사 준비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일을 중심에 놓고 틈새에 밥을 먹었다. 식사준비와 밥 먹는 시간이 평화로워야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도 건강해지기 어렵다. 몸과 마음은 서로 너무나 은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절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 늦게 안 사실이다.
시골에 내려와서 맨 처음 한 일은 ‘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이었다. 어떤 연명 치료도 받지 않을 것임을 정리하여 이름 석자를 쓰니 죽음을 구체적으로 가까이 대면하는 느낌이 들었다. 더 이상 건강 관련 검사를 당분간 하지 않을 생각이며 운동과 잘 먹는 것, 편안한 마음과 휴식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언젠가 큰 병이 온다면 담담히 받아들이고 즐겁게 살 수 있을 만큼만 살다가 가리라 생각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듯이 말이다. 내게 복이 있다면 내 집에서 마지막까지 이웃들과 즐겁게 대화를 하다가 잠들 듯 갈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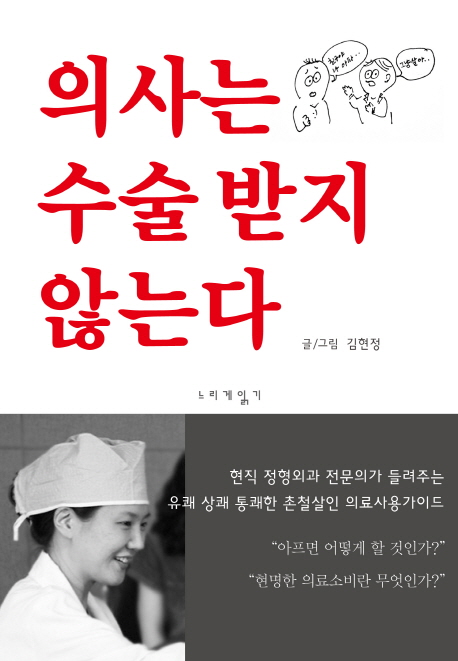
오늘 <의사는 수술 받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으니 마음이 훨씬 편해진다. 이 글을 쓴 정형외과 의사인 김현정은 ‘건강열풍, 의료 과잉현상, 건강 찬양, 의과대학생 증후군, 건강염려증, 신약과 진단장비 개발’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은 더 건강해졌는가? 인류의 삶은 더 바람직해졌는가?’ 묻는다. 그리고 ‘말 안 듣는 환자의 승리’, ‘몸이 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인 사람들의 승리’에 대해 소개한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나의 길에 응원을 보내는 듯하다.
오늘은 신해철씨의 1주기라고 한다. 지금과 같은 자본의 영리 속에 의료가 편입해 있는 구조에서는 수많은 의료사고와 의도적 책임회피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불안을 조장하여 그들의 시스템으로 들어오라고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는 거미줄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빠져나와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내고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해철씨가 살아있다면 아마 이런 운동에 동참했으리라 믿는다. 삶의 격은커녕 생존마저 지키기 힘든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몸까지 지키기 어렵게 됐음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훌륭한 음악가로 고단하게 살다간 신해철씨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