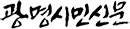괴산의 좋은 점이 무지 많지만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물이 좋다는 것이다. 10년 전 이곳에 조그만 오두막 같은 집을 짓고 먹을 물을 위해 지하수를 판 후로 우린 괴산의 물을 서울로 가져다 먹고 있다. 아이들은 괴물이라는 재밌는 줄임말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 식구들은 모두 괴물이란 이름을 당연시 하고 있다.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자란 나는 서울 살이를 시작하면서 겨울철만 되면 아토피로 고생을 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목욕탕은 내게 안 갈수도 없고 다녀오고 나면 몇 시간을 느낌이 좋지 않아 고민거리였다. 락스 냄새가 채 빠지지 않은 탕의 냄새도 괴롭고 지나치게 건조하고 따끔거리는 피부도 참 괴로웠다.
그래서 난 가능하면 탑골에 내려가는 길에 목욕을 하는 편이다. 허름하기가 서울과는 비할 수 없는 오래된 읍내의 동원탕이 내가 자주 가는 곳이다. 물론 더 이상 가까운 곳에 다른 선택지가 없기도 하다. 그곳에 가면 드나드는 사람들도 목욕탕의 역사처럼 하나같이 등이 굽은 사람들이 많다. 어르신들은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은 제대로 서 계시지 못하고 앉아계실 때도 불안해 보이신다. 탕에 계시다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 무릎과 다리 전체에 수술흔적이 분명한 분들이 많다. 마치 청바지 옆선을 박음질해 놓은 것처럼 다리부터 허벅지까지 재봉선 같은 흉터가 있는 몸을 겨우 끌며 아픔을 하소연 하시는 분들도 많다. 어디에 쇠를 박았다는 둥, 수술 후가 더 아프다는 둥, 어느 병원가면 잘 본다는 둥 동원탕은 노인들의 의학정보가 모이는 곳이 되기도 한다.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이 든다는 것의 서글픔을 미리 느낀다. 모두가 인공뼈나 수술로 연명하시는 그분들이 그로 인해 통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로도 별반 차이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다니시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
동원탕의 풍경이 서울과 다른 점은 노인분들이 많다는 것 뿐 아니다. 대부분 혼자 오시는 분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딸이나 며느리가 꼭 붙어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는 옷을 벗겨 드리는 일부터 깔고 앉을 의자를 마련하는 일, 탕에서 몸을 불리는 일, 머리를 감고, 때를 밀고 ,몸을 헹구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다시 옷을 입는 전 과정을 모시고 온 딸이나 며느리가 끝까지 보살펴 드린다는 점이다. 가끔은 돌봐드리는 분의 처지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은 같이 늙어 가시는 분들도 많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절대 돈을 주고 때밀이를 부르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오늘 모시고 온 어느 분은 그 정도가 심해서 탕 안에서 자꾸만 정신을 놓으시려 했다. 그랬더니 딸이 찬물을 떠다 얼굴을 씻겨 드리며 정신을 붙들어 주시며 말을 시키셨다.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봤지만 다행히도 그 어르신은 근근이 버티시는 것 같았다. 난 저런 분들은 앞에 놓인 때밀이 침대에 누이고 편안하게 목욕을 시켜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돈 걱정 없이 목욕할 수 있도록 노인돌봄정책이 만들어져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모두 무료로 때를 밀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목욕탕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때밀이를 이용하는 분들은 피부도 곱고 젊은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그녀들이 탕 안에서 자신 있게 서 있으면 몸에 공을 들인 티가 나고 피부가 반짝여 보였다. 그러나 난 그 빛깔이 예뻐 보이진 않았다. 옆을 돌아보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서로 가난에 기대어 아슬아슬 몸을 씻는다는 기본행위도 위험해 보이기 때문이다. 할 수만 있다면 서로의 온기와 피부를 가까이 하며 등을 밀어주는 일처럼 정다운 풍경이 또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런 풍경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도 아쉽지만 동원탕에서 만나는 장면은 그런 낭만을 뛰어넘는 상황으로 보일 때가 많다.
동원탕에서는 몰라도 모르는 사이가 안 된다. 누구라도 말을 시작하면 다 끼어들어 대화가 확산되고 아무라도 웃어주며 깜빡하고 못 가져온 샴푸도 나눠쓴다. 처음 보는 사람끼리도 때수건 내밀며 등 밀어 주는 장면은 일상적이다. 나의 촌스러움은 이런 데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된다.
목욕을 끝내고 탈의실에서 물기를 닦고 있을 때였다. 원래 탈의실에선 더 활발한 대화들이 나올 때가 많다. ‘아들이 병원비를 대줬다거나 딸이 쌍둥이를 낳았다거나 손주가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 어느 마을의 누가 몇 달간 병원신세를 지고 있다는 정보’를 나도 다 들어버릴 정도다. 한창 얘기 중이시던 어느 어르신이 조금 더 젊어 보이는 아줌마가 속옷을 갈아입는데 얼른 다가가 끈이 말린 것을 똑바로 펴 주신다. 당연히 두 분을 서로 모르는 사이다. 그러나 동원탕에 들어오면 그런 거 다 소용없다. 내 등에 묻어있는 머리카락을 털어주신 분도 계신다. 끊이지 않는 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조금 전 말린 속옷을 펴주신 어르신이 옷을 입으시는데 이번엔 그분 옷이 잘 펴지지 않은 게 내 눈에 띄었다. 그래서 내가 다가가 그분 속옷을 제대로 펴 드렸다. 성격 좋아 보이는 그 어른신은 내게 미소를 보이시며 말씀하신다.
“다 남의 덕에 사는 거여! 어디 혼자 살수 이깐디~”
그 순간 나는 인문학자들의 책을 읽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공부를 한 것 같았다. 어르신은 내게 명언을 하신 줄도 모른 채 계속 대화에 열중하셨다. ‘도시라면 다른 사람의 실수나 오류에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었을까? 맨살끼리 만나 웃으며 도와줄 수 있었을까? 그 손길에 미소 지으며 이웃이 될 수 있었을까?’ (201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