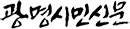느리게 산다는 건 배부른 소리일수도 있다.
맨날 바쁘게, 맨날 시간 없는 우리들 일상에 늘 시각은 똑딱거린다. 없는 시간은 가슴 밑바닥에 하늘거리던 다른 사람들 마음도, 얼굴도 사라지게 하기도 한다. 우리가 시간을 조절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끌고 다니는 꼴로 살게 된다. 허덕이다 돌아보면 누더기가 다 된 허망한 몰골이 거울 속에 있을 때도 있다. 중요하다고 ,지금 꼭 해야 한다고 했던 일들이 손가락 속 모래알처럼 스르륵 흘러내릴 때 대부분은 땀의 기억만 남아있기도 하다.
학교를 그만두고 처음 느낀 경이로움은 ‘모든 요일이 평등해졌다’는 것이다. 세상에! 지옥 같던 월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같은 느낌일 수 있다니,,,,,,. 그 동안 요일마다 감정의 무게와 색깔이 달랐던 게 모두 누군가 덧씌운 굴레였단 말인가? 평등한 요일, 그러니까 매일 매일이 하루가 어떻게 찬찬히 흘러가는지 몸으로 느끼는 시간들은 정말로 훌륭했다. 해가 뜨거나 지는 일부터 마을과 나무들이 내는 작은 소음들과 그때의 감정흐름까지 섬세하게 내 것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요일이 사라졌다!’
무언가를 셈하고 규칙을 정하는 일은 보통 사람에겐 필요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누군가를 지시하고 지배하는 언어들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중엔 그 굴레가 스스로를 억압하는 것인지도 모른 체 우리는 부지런히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엔 오래 가고 싶었던 따뜻한 남쪽에 갔다. 남원이 고향인 나는 남쪽은 무조건 좋아한다. 음식도 말도, 사람도 풍경도,,,,,,.기차를 타고 순천역에 내려 순천시티버스를 타고 시내 구경을 한 뒤 인터넷을 뒤져 ‘와온 마을’이란 곳을 찾아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해안은 모두 관광지가 되어 조용하게 머물 곳이 다 사라져버렸다. 모든 바닷가가 횟집과 팬션으로 둘러쳐있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상가들에서 내는 소음들로 북적이는 그야말로 소비를 위한 공간이 돼버린지 오래다.
오래동안 학교라는 소음 공동체에서 지낸 후 나는 자본이 덜 들이닥친, 그리고 사람이 적은 곳을 찾게 되었다. 그러나 가서보면 실망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와온마을’은 기대 그 이상이었다. 와온은 소가 누운 형상이라 붙여진 이름이라 했다. 순천역에서 버스를 타고 와온이란 데를 찾아갔다. 전화로 숙소를 예약하고 주인에게 가는 길을 물었다. 버스엔 마을 어르신들 몇 분도 계셨다. 정거장에 정차할 때마다 넘어질 수 있으니 미리 일어서지 말라는 방송이 나왔다. 방송대로 어르신들은 누구도 미리 일어서지 않았다. 충분히 기다려주는 버스 기사와 방송의 지시를 잘 따르는 와온행 버스는 서로의 신뢰 속에 절대 사고가 날 것 같지 않았다. 노인들만 남은 시골버스의 풍경을 보며 와온2반이 나오길 기다렸다. 드디어 와온2반을 안내하는 멘트가 나왔을 때 내 입에서 탄호성이 나왔다. 바다가 너무나 아름답게 펼쳐져있었기 때문이다. 뻘이 드러난 와온 바다는 오랫동안 내가 찾던 바로 그 바닷가였다. ‘이곳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 마음이 예쁠 것 같아!’ 내 말에 같이 간 선생님이 미소를 보였다.

숙소에 가방을 두고 해가 질 때가지 바닷가를 걸었다. 해변의 매화 밭에선 작은 청매화가 진한 향을 품고 있었다. 그렇게 두발로 걷는 여행이 아니었다면 그 향기를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해가 지는 풍경인 노을을 놓치지 않으려고 바삐 움직이며 목이 아프도록 바다와 태양의 움직임만 보며 걸었다. 바다를 향해 움직이던 해는 오랜 여운을 드러내며 빛과 색의 향연을 보여주었다. 갯벌이 붉게 길이 나기도 하고 갈대에 그 빛이 반사되기도 했다. 우리도 곁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반사되어 보일 것이다.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도 저리 예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바라보고 싶고 떠나고 싶지 않고 또 생각나는,,,,,,.
느린 여행을 하는 사람이 쉽게 갈 식당이 주변엔 없었다. 대신 우리는 와온슈퍼에서 만들어준 해물라면을 먹었다. 국물이 얼마나 맛있던지 라면 먹을 때마다 와온마을 생각할지도 모른다.
온돌방인 숙소에서는 묵은 피로를 다 풀만큼 숙면을 취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엔 전날과 반대 방향의 바닷가를 걸었다. 2시간 가까이 걷는 동안 외지인 한명을 만나지 못했다. 농사 준비를 하는 농부와 그물 손질을 하는 어부들을 봤을 뿐이다. 차도 사람도 없으니 바다를 독차지한 느낌이었다. 다시 순천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도시로 나와 웃장이란 곳을 갔다. 마침 장날이라 했다. 싱싱하고 먹음직스런 과일과 생선들이 즐비했다. ‘그랑께 이천원만 내고 다 가져 가쇼~’ 전라도 사투리가 정겹다. 웃장에서 유명하다는 국밥도 먹었다. 국밥을 시켰는데 머릿고기와 순대도 한 접시 주신다. 푸짐한 인심이다. 함께 간 사람이 술을 좋아했다면 낮술을 했을 것이다.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에서도 나는 바다를 가득 품어 부자가 된 듯 했다. 와온마을! 또 만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