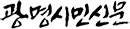글을 읽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미 오늘의 교육을 통해 몇 년 전부터 소개됐던 글들인데도 똑같은 글을 다시 보며 또 분노하고 부끄러워했다. 서문에 조영선이 쓴 내용처럼 이번 촛불 또한 ‘허용한 범위 안에서, 지배자들의 이윤을 빼앗지 않는 선에서 진행됐다’는 지적과 함께 ‘선을 넘지 않는 혁명’을 볼 수 없었단 말이 기억에 남는다. 학교는 ‘선을 넘지 않는 사람들’과 ‘선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그렇게 오래 익숙해진 교사들이 학생들을 같은 방식으로 길들이는 곳이기도 하다. 아이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는 그 반만이라도 교사들의 성찰도 동시에 필요하다. 우리가 쓰는 언어들, 바라보는 곳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습관 속에 수정되고 바꾸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성찰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후에도 학교는 기껏 양말의 색깔이나 염색정도의 허용 말고 뭐가 더 나아졌는지 학생들은 묻는다. 학생회나 동아리활동 모두 지도교사와 학교 측의 감독과 불편한 지시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뿐 아니라 학교가 그어 놓은 경계를 벗어나는 순간 괴롭힘과 격리를 당한다. 중·고등학교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문제 학생’을 제거대상으로 보는 듯하다. 전학을 강요하고 자퇴를 권고하는 일을 밥 먹듯 하고 있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감옥처럼 학생의 외모와 수업 외 활동까지 규제하고 설문조사나 대자보 하나 공간에 붙일 수 없는 상황에 관심이 없다. 야간자율학습뿐 아니라 방과후 활동, 학교 특색의 리코더대회까지 다 강요된다. 나는 초등교사출신으로 치마 길이까지 규칙에 적어놓은 걸 보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더 어린나이에는 맘껏 자유를 누렸던 아이들이 왜 자아가 커진 나이에 그것도 한창 멋을 부릴 나이에 이렇게 까지 규제를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교문지도를 하며 학교 등굣길부터 감시가 시작되고 체크되는 학교에 등교하고 싶겠는가? 민주시민 교육은 학생들을 꼼짝 못하게 하면서 형식적 내용과 시수 채우기로 진행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는 아주 극소수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조직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학교 민주화를 위한, 혹은 학생 인권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지나칠 정도로 시달리고 감시당하며 결국 자괴감과 모멸감 그리고 서러움으로 눈물 흘린다. 학생들의 글을 읽으며 오래전 전교조 가입을 이유로 당했던 감시와 괴롭힘, 부모까지 동원해 끝끝내 탈퇴각서를 받아냈던 교육청과 학교관리자들의 모습이 떠올려졌다. ‘교장의 강요로 학교에 남겠다면 각서를 쓰라고 했을 때 죽고 싶었다고, 각서를 쓰는 손목을 잘라 버리고 싶었다.’는 글을 읽으며 학생처럼 나도 울었다.
학교의 문제, 교육의 문제는 당사자인 학생들이 처한 생존의 문제이다. 그런데 그걸 제기하면 조직의 배신자로 내몰고 무시하고 학생이 회유되지 않으면 부모를 공략하는 비열한 방법은 학교가 학생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게 해 준다.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학교의 어떤 일에도 주체로 설 기회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민주시민을 기르겠단다. 지금 우리 학교는 ‘광장에도 없고 학교에도 없는’ 그 민주주의를 입으로만 핥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