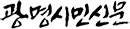광명사람들> 철산4동 유경선씨 |
성당지기 ‘아저씨’의 사는 이야기 |
|
|
|
|

|
▲ 철산성당 관리장으로 일하는 부지런하고 마음편한 '아저씨' 유경선씨 |
|
보통사람? |
|
보통사람들의 이야기란 어떤 것일까? ‘보통사람들’이라는 개념 역시 자의적 일 것이다. 일전에 전임 대통령이 자신을 ‘보통사람’으로 규정을 했던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광명사람들’이라는 코너는 ‘보통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 한 코너다. 그러나 ‘무엇인가 흥미거리를 찾고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가?’ 하는 반문도 들 때가 있다. 그러다 보니 또 다시 ‘보통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어려운 숙제거리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들, 서민들, 소시민들의 이야기.
다시 광명사람들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가족을 구성하고, 현실 속에서 살다보니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도 많다. 그래서 꿈을 일찍 접기도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삶을 통해 안분지족(安分知足)하는 것이 우리네 삶의 단상일지도 모른다. 이마저 유지하기 힘들면 삶이, 인생이 곤경에 처한다. 경제적 어려움까지 수반하면 그 곤경은 더욱 심해진다. 그럼에도 이러한삶의모습속에평범하게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겨있기에, 우리는 이 속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다. 때론 영웅담을 그리면서도. |
|
“만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인사하는 것이 재미있다.” |
|
한 ‘성당지기’가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 동화적이고 낭만적이다. 기자도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는 여지없이 실패다. 그리고 당혹스러움을 감춰야만 했다. 바로 마음을 가다듬고 다음 이야기를 진행했다. 바쁜 일과 중에 잠시 짬을 내준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광명사람으로 만난 이는 철산성당을 지키고 있는 철산4동 유경선(47)씨다. 세례명은 체칠리오다. 세례명을 받는 경위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한다. 유씨의 경우는 카톨릭 중세 성인들을 모아놓은 책에서 생일이 같은 성인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선택한 경우다.
유씨가 천주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97년도 일이다. 아는 아주머니가 집요하게(?) 전도를 해서, 그 정도 소원은 들어 주어야지 하는 것이 계기가 된 것이다. 그 전에는 무신론자였다. 이런 인연 때문인지, 유씨는 2000년부터 이 곳 성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신도가 2천명이 넘는, 광명에서는 큰 성당이다. 이곳에서 유일하게 성당을 관리하는 ’관리장‘이 유씨의 공식 직함이다. 성당의 시설을 관리하고, 성당에서 진행이 되는 여러 행사와 모임을 지원하는 일들을 한다. 규모있는 성당이니, 그가 맡은 일이 얼마나 될지는 짐작이 된다. 월요일과 토요일은 다른 여신도들이 성당 일을 하는데 참여를 한다고 한다. 유씨 입장에서는 다행일 듯하다. “신도가 많다보니, 이름을 다 기억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대충 얼굴은 다 안다. 다양한 많은 사람을 만난다.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가 다 틀린 것이 재미있다.” 유씨의 말이다. |
|
부지런하고 마음편한 ‘아저씨’ |
|
성당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은 유씨를 이렇게 평한다. “부지런하고, 꼼꼼하다. 신도분들에게 싹싹하다. 편해서 ‘아저씨’라고 부른다. 신도들도 대부분 그렇게 부른다.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열심히 사시는 분이다.” 유씨는 그런 사람이다. 성당에서 ‘아저씨’로 불리우는 것이 좋은 것이다. 기독교나 천주교 관련 종교기관에서는 통상 ‘형제,자매’라는 호칭이 널리 사용된다. 그럼에도 ‘아저씨’가 더욱 친근하게 사용이 된다. 유씨의 캐릭터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지도 모르겠다.
유씨가 성당지기로서 개성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은 단지 유씨의 외형적 모습, 태도에 기인하는 것만은 아닌 듯 하다. 삶으로 살고 있는 모습 때문이다. 유씨는 생활의 대부분을 성당에서 보낸다. 아침7시에 성당에 출근한다. 퇴근은 저녁 10시다. 모임이 끝나고, 정리를 하고 가는 시간이다. 목요일이 쉬는 날이다. 유씨는 부지런히, 성당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이 이렇게 이루어지다보니, 유씨에게는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마음에 걸린다. 그래도 일은 할만한가 보다. “75세까지 성당에서 일하고 싶다”고 한다. 물론 정년을 훌쩍 넘는 나이다. ‘힘이 있을 때까지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곳이 성당이면 더욱 좋은 것이다.
또 있다. 유씨가 ‘아저씨’일 수밖에 없는 것이. 기자가 질문했다. “성당에서 일하면서 가장 기뻤던 일은요?” “월급 오른 날” “그러면 보람은 언제?” “어르신들에게 칭찬 받을 때다. 열심히 일한만큼 알아준다.” 두 자녀를 둔, 그리고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않는’ 가장의 간단(?)하고도, 평범(?)한 답변이다. |
|
나도 한 때는 경제인연합회 회장이 꿈이었다오. |
|
유씨도 누구나처럼 젊은 시절 ‘풍운의 꿈’을 꾸었다. 중학교때다. 당시 경제인연합회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때, 유씨는 경제인연합회 회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당시 학교 담임선생도 ‘그게 뭐냐?’고 질문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유씨는 그 꿈을 오래도록 간직을 했다. 지금도 현실성은 없지만,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현실 가능성이 없지만, 그렇다고 꿈을 포기하는 것과 간직하고 있는 것의 차이를 새삼 혼란스럽게 생각해보는 지점이기도 했다.
부친이 쌀집을 한 것이, 이러한 꿈을 꾸게 된 배경이 된듯하다. 언뜻 “정주영 회장과 비슷한 길을 걸을 수도 있었다.”라고 기자가 농을 걸자, 돌아오는 대답이 가관이다. “배포차이다. 남자는 허왕되더라도 배짱이 있어야 한다.” 결국 배짱차이라는 것이다. 장사꾼으로 성공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기에, 한때는 그런 길을 걷기도 했다.
조금 더 유년시절로 가보자. ‘될 수 있으면 착하게 살자.’ 유씨의 인생관이다. 그러면서 인생관이라고 말할 것도 없다고 한다. 단지 어린시절 시골에 살면서, ‘서리’를 많이 했다는 것이다. 주동자였다. 당시 시골에서 ‘서리’는 ‘놀이’였다. 놀이거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도 원칙은 있다. 필요한 만큼 만이다. 필요이상의 서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의 한 면 아닌가라는 것이다. |
|
술? |
|
카톨릭은 개신교(기독교)에 비해 문화가 관대한 면이 있다. ‘술’이 그렇다. 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씨에게는 이러한 문화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개인이 술을 즐기는 것은 자유다, 개인의 선택이다. 그러나 술을 마신다는 것도 어찌보면 하나의 문화다.그런 문화를 좋아하고 즐기는 이가, 전혀 엄격한 분위기의 공간에서 일을 해야 한다면 아마도 그건 고통일지도 모른다.
유씨는 술 이야기가 나오자, 얼굴에 미소가 돈다. “즐긴다. 술 마시는 분위기를 좋아한다. 술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한다.” 너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해 당황스러울 정도다. 한술 더 뜬다.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최고가 ‘술’이다.” 이쯤되면 ‘애주가’라고 해두자. 더 이상 평을 단다는 것이 무리다. ‘안 되는 것이 없다’는데. (사실 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유씨는 취중인터뷰가 적격이다. 서로 동감을 했다.) |
|
사람 사는 것 다 똑같다. |
|
유씨는 광명에 대해 그다지 높은 점수를 주지는 않는다. 88년 즈음 광명에 들어와 지금까지 살고 있다. “사람 사는 것 다 똑같다. 아웅다웅하고,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어느 때는 다른 지역보다 각박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고향이라는 생각 없고, 직장 따라 오고. 떠나고 싶은 사람 많을 거다.” 범인(凡人)의 눈에 비치는 우리네 사는 모습인지도 모르겠다.
유씨 는 작지만 다부진 체구를 가졌다.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일터에서 부담없는 ‘아저씨’로 불리기를 바라는 그의 삶이 아름답다. 기자가 성당을 찾았을 때도, 그는 지하실에서 물이 새는 곳을 찾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성당이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기에, 외부에 맡겨지는 것보다는 직접 문제 해결을 찾는 중이었다. 그러면서 기자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바쁜 일손을 기꺼이 놓아 주었다. 성당지기의 그럴듯한 이야기를 찾아 갔던 발걸음이 민망했다. 이곳은 그의 일터다. 생존의 공간이다. 언제가 먼 훗날, 75세 즈음, 살아 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때, 경솔하게 찾았던 성당지기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
|
|
|
|
|
<2003. 9. 18 강찬호기자tellmech@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