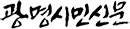악몽을 꾸었다.
세상에 !
내가 공부를 가장 못하는 학생이었다.
과학시간이었는데 남들이 다하는 숙제도 해오지 못하고 혼자서 쩔쩔매고 있었다. 선생님은 무서운 공포로 내게 겁을 주고 야단을 쳤다. 친한 친구가 나를 도와주려 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안타까워하는 친구모습도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았다. 그냥 나는 낙오자였다.
그 느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모른다. 그냥 천길 낭떨어지로 추락하는 기분이었다. 도망치고 싶어도 꼼짝도 할 수 없었고, 나를 둘러싼 멸시의 시선들과 커다란 덩치의 쇳덩어리 같은 느낌의 선생님은 지옥보다 더 끔찍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나는 두려움과 모멸감으로 가득했다. 얼굴을 들 수도 없었고 눈물을 흘리며 이 상황에서 사라지고만 싶었다. 그러다 꿈에서 깨어났다.
영화 ‘지상의 별처럼’은 나에게 이런 후유증을 남겼다. 그런데 그 꿈을 꾼 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20년 이상을 좋은 선생노릇 해보겠다고 살았는데 이렇게 절절한 마음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머리로 생각하는 도움이나 안타까움이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헛수고인지 알지 못했다. 아이에게 맞는 도움을 주려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냥 ‘열심히’만 강조한다. ‘사랑’이면 다 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가끔은 그 열정이 아이를 두 번 죽이기기도 한다.
영화에서 주인공 ‘이샨’은 여덟 살이다.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샨은 인정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아이이다. 나중에 이샨이 난독증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기 전까지 이샨은 그냥 ‘바보, 멍청이’일 뿐이었다. 글자를 읽지도 쓸 수도 없고 몇 번씩 가르쳐준 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단추를 바르게 끼거나 공을 받고 던질 수도 없다. 그러니 수업시간엔 늘 혼나고 야단맞는다. 학년도 유급당하고 친구들과는 관계를 맺을 수도 없다.
그러나 이샨은 자신만의 세상이 따로 있었다. 물고기를 좋아하고 돌이나 나뭇가지도 이샨에게는 상상력과 창조의 세상으로 바뀐다. 글자들이 춤을 추고 숫자들이 놀이한다. 야단맞고 혼자여도 자신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괜찮은 이샨. 그러나 이샨의 부모님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 강압적으로 기숙학교로 보내기로 한다. 울며 사정하는 이샨이 강제로 가족과 떨어진 후 말을 잃고 모든 호기심도 사라진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바로 미술 선생님 ‘니쿰브’다. 아이들을 처음 만나는 장면부터 아주 특별했다. 악기를 연주하고 배우 같은 의상을 하고 나타나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허용적인 분위기와 관계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준다. 이 선생님은 이샨의 아픔과 문제를 진단해내고 이샨에게 진정으로 다가간다. 난독증 아이에게 맞는 방법으로 글자를 하나씩 익히게 도와주고 이샨이 가진 탁월한 재능도 키워준다. 이샨을 미술선생님과의 만남에서 새롭게 자신을 찾아가고 학교에서의 생활에도 활력을 얻는다.
이 영화는 경쟁만능주의에서 아이들을 다그치고 몰아대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아이시선으로 보여준다. 인도와 우리가 너무도 닮아 부끄러움을 공유한 자리 같았다. 그리고 나는 악몽을 꾸었다. 나는 한번 악몽을 꾸었지만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자주 이런 악몽을 꿀까? 아니 매일매일이 악몽인 아이들도 있을 것이다. 나는 니쿰브같은 선생인가? 나의 악몽은 우리를 구해달라는 아이들의 메시지일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