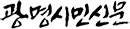양영희의 길 위에 서서
햇볕이 쨍쨍한 거리를 양산을 들고 엄마랑 침 맞으러 다닌다. 한 달쯤 전에 무거운 짐을 들다 삐끗한 손목이 많이 불편하다 했더니 엄마가 다니시는 단골 병원에 같이 다니자고 하신 거다.
‘그러다 큰 일 난다. 빨리 치료 받아야 혀’
행주를 짜는 일도 불편하고, 냉장고 문도 열기 힘들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하는 것도 힘들어지면서 (평소엔 손목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지 몰랐다. 우리들의 일상은 정말 내 몸부터 많은 감사함이 들어있는 걸 깨닫는 순간이다.) 나는 엄마 말을 들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들은 다 엄마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아이들에게 ‘왜 말을 안 듣느냐고, 제발 엄마 말 좀 잘 들어라’ 하며 산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질 것 같진 않다. 보고도 속고 하면서도 속고 당하면서도 속게 되는 인류의 법칙 같은 걸까?
아무리 천천히 속도를 줄여도 엄마랑 나란히 걷기가 힘들다.
엄마는 ‘빨리 갈라고 애를 써도 허리가 무거워서 안 따라와야.’ 하신다.
이 말에 엄마도 나도 한참을 웃었다. 몸도 마음대로 분리해서 사고하는 그 위대함, 나이가 든다는 건 인간이 가진 모든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여름에 침을 맞고 뜨거운 찜질을 받는 건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엄마랑 나란히 누워 도란도란 얘기하니 참 좋다. 엄마도 딸이랑 함께 치료받는 게 좋으신지 딸의 일정에 모두 맞추어 항상 ‘안 따라오는 허리’를 부여잡고 즐겁게 동행 길에 오르신다.
(2013.8.6.)
저작권자 © 광명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