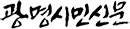이번 방학, 차를 놓고 여행하기로 맘 먹은 두 번째 길을 떠났다.
전철을 타고 남부터미널로 가서 임실 가는 버스를 탔다. 타고 보니 고속버스가 아니라 시외버스다. 허름한 버스에 10여명이 앉아있다. 모두 어릴 적 마을에서 만났을 것 같은 느낌의 정겨움이 묻어나는 사람들이었다. 고향 쪽 버스이니 그냥 사람들에 대한 마음도 열린 채 들어온다. 2시간 30여분을 지나 전주에 도착하니 승객 3명만 남고 모두 내린다. 기사님께 화장실을 다녀와도 되는 지 묻고 전주터미널의 화장실을 이용했다. 그리고 자리를 바꿔 앉아도 되는지 물었다. 기사님은 걸죽한 전라도 사투리로 말했다. ‘맘대로 골라 앉아요. 이 차는 손님들 차지지, 내 것이 아니니께’ 하신다. 그리고 손님이 거의 없는 버스를 운행하는 어려움과 모두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을 끌고 나와 길을 막히게 하고, 교통사고를 내며, 기름을 써대는 풍토를 질타하신다. 나도 그들 중 하나로 살고 있다는 말은 못했다.
3시간 30분이 걸려 도착한 임실에서 식당에 들어갔다. 백반을 시켰는데 김치찌개 외에 반찬이 10개쯤 나온다. 게다가 모두 맛있다. 혼자 먹는데도 이렇게 맛있다니! 역시 음식은 전라도다. 이다음에 ‘어디에서 살고 싶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그냥 ‘전라도’라고 말할 것이다. 매일 먹는 음식이 이렇게 좋은데 뭘 더 바라겠는가? 밥을 먹으며 ‘임실 청소년 수련원’ 가는 길을 물었다. 다른 손님들께서 택시타면 비싸니까 관촌 가는 버스를 타란다. 버스도 자주 있고 내리면 바로 옆이니 걸어가면 된다고 하셨다. 주인과 옆의 손님들이 모두 당신들의 대화를 중단하고 나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설명해 주신다. 이곳은 어디서 무엇을 물어도 편안하다.
다시 터미널로 들어가 관촌행 버스를 기다렸다. 더운 날 임실터미널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작은 보따리를 옆에 두고 계셨다. 오래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났다. 복숭아를 깎아 맛을 권하며 장사하는 아주머니도 차를 안내하는 할아버지도 삶에 지친 모습이지만 그 모습도 정겹다. 관촌행 버스가 오자 이방인으로 보이는 내게 차를 타라고 먼저 안내해 주신다. 기사님께 장소를 말하고 그곳에서 내려달라고 부탁드렸다. 기사님은 정류장도 아닌데 연수 장소로 걸어갈 수 있는 곳에서 날 내려주셨다. 그런데 너무나 뜨거운 태양아래 그분들이 ‘아주 금방이여~’하는 곳은 ‘저기 멀리~’있었다. 아찔했다. 그냥 길이어서 택시도 뭐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트럭이 한 대가 지나갔다. 내가 손을 들까말까 더위에 지친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 트럭이 한참을 가다 깜빡이를 켜고 서 있었다. 나를 기다리는지 다른 일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뜨거운 햇살을 손으로 가리며 트럭 있는 곳까지 갔다. 그분은 통화중이셨는데 내가 태워줄 수 있는지 묻자 흔쾌히 타라고 하셨다. 먼 거린 아니었지만 걷기엔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그렇게 해서 무사히 연수 장소에 도착했다. 차를 운전해 도착 했을 때와는 다른 감동이 참 좋았다. 지역을 만나고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그 느낌으로 전국에서 온 선생님들과 만나니 더 반가웠다. 연수에 참여하는 것도 과정을 여행으로 살려내니 새롭고 좋았다.
임실과 진안에서 만난 두 학교(임실 대리초, 진안 장승초)와 마을 이야기는 지금껏 만났던 학교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였지만 전북은 또 그들의 역사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훨씬 감동이 있었다. 그 까닭을 굳이 표현하자면 그곳엔 마을이 있었다. 임실 대리초와 진안 장승초 이야기의 공통점은 학교를 중심으로 새로운 마을이 만들어지고 그들은 그 문화와 관계의 중심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선생’이 라는 직업으로 학교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꺼이 그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고 마을로 들어갔다. 마을 주민들과 닮은 모습으로 삶을 바꾸는 전환이 그들과 마을을 잇는 관계형성에 아름다운 씨앗이 되었다. 교사와 학부모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 냈다. 폐교 직전의 상태에서 학부모들을 설득해 이사 오게 하고 학부모와 함께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온 몸으로 헌신했다. 그리고 3년 지난 그곳엔 그전과 전혀 다른 생기가 퍼지고 있었다. 20명을 넘지 못했던 학교가 100여명의 학생들로 붐비고 그 행복을 함께 하고픈 주변 지역의 방문이 끊이질 않는 곳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 마을 학교 만들기를 이뤄온 모든 사람들은 그 결과를 맘껏 즐기고 있었다. 세상에서 ‘행복’을 말할 때 바로 이런 순간을 떠올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첫날밤 임실 대리초에서 보여준 두 학교의 학부모, 아이들 공연은 한여름밤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다. 장승초의 교실증축도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설계 계획부터 모든 과정을 교육청이 협조하여 교실마다 2층 다락방을 만드는 멋진 결과를 얻어내기도 했다고 한다. 우리가 꿈꾸었던 교실을 거기서 보았다. 혁신은 꿈을 이루게 하고 그 가능성으로 다음 희망이 설레며 다가오게 하는 것이다. 곳곳에서 좌초되는 경험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그냥 머물게 할 뿐이다. 전북에서 경기도의 혁신학교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경기도의 혁신학교에서는 보기 힘든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눈에 띄었다. 또 군수나 지자체의 따뜻한 지원도 돋보였다. 120명의 작은학교연대 연수 참여교사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 인사와 환대를 보여준 전북의 분위기도 부러웠다. 임실과 진안에서 만난 사람들과 시간들은 부러움과 응원의 박수, 그리고 다시 안게 된 과제를 남겼다.
201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