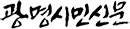2003년 3월 29일 토요일
지난 27일 한국 대사관 앞에서 촛불 시위를 가진 뒤, 그 자리에 모인 각국의 평화활동가들과 함께 ‘peace coalition'이라는 약식 모임을 꾸렸다. 우리가 이곳 암만에서 커다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작은 힘이나마 서로 마음을 맞추어 힘을 모으자는 것이었다. 그날 당장 이야기한 것은 날마다 이곳 암만에 평화의 촛불을 밝히자는 것. 날마다 하는 것이 어렵다면 매주 토요일이라도, 또는 하루에 한 팀씩 책임을 져서 날마다 돌아가며 촛불이 꺼지지 않게 이어가자는 것. 아니,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팀의 형편에 따라 해나가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정한 것은 29일 토요일, 로마 극장에서 첫 불을 밝히자는 거였다.
오늘이다. 오늘 첫 모임은 우리 한국팀에서 준비하기로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만나서 더 의논해 보아야겠지만 일단 오늘 로마 극장에서 첫 집회를 갖기로 했다. 아침부터 선전문을 만들어 평화 활동가들이 봄직한 자리에 붙였고, 오늘 집회에 쓸 촛불과 선전물 따위를 더 준비했다.
부담이나 걱정도 적지 않았다. 우리가 계획한 것은 지난 번 대사관 앞에서 한 것과 달리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하는 것이다. 대사관이 모여 있는 쪽은 그야말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곳이기도 했고, 나름대로 걱정스러운 상황(체포 및 추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내는 다르다. 우리 계획이야 우리 뜻을 담는 피켓과 함께 평화롭게 촛불을 밝히며 기도하는 것이지만, 이곳 사람들이 흥분해서 모여들 것을 충분히 떠올릴 수 있었다. 이를 테면 지난 번 ‘수미싸니’ 쪽에서 투석전을 하면서 군인과 대치 상황까지 갔던 집회 같은 것을 말이다. 이곳 사람들, 특히 감정이 크게 받친 이라크인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니 우리의 질문에 무어라 뚜렷이 답할 수 없었다. 피켓과 촛불만만으로 평화로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또는 사람들 사이를 걷는 것만으로도 당국의 제지를 받을 것인지, 받는다면 어느 정도로 받을 것인지. 또는 우리가 계획한 만큼 우리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지.
우리가 듣기로는 이 나라에서는 피켓만 들어도 체포 내지는 추방이라 했고, 집회 허가를 받는 일은 거의 어렵다고 들었다. 더구나 흥분한 시민들이 지난번처럼 과격한 상황을 낳을 경우 그것은 더욱 곤란해지는 것이었다. 어차피 이곳에서는 우리가 나서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리라는 건 알고 있다. 지난 투석전이 있던 시위 때에도 수많은 군중이 우리 뒤를 따르며 둘러쌌고, 그 날의 시위 뿐 아니라 엊그제 대사관 앞 집회를 가진 우리의 모습 또한 이 나라의 각종 방송이나 신문에 크게 나갔다.
뚜렷하지 못한 이런 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집회를 그야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촛불을 밝히는 것으로 계획했다. 그것마저 할 수 없는 것인지, 혹은 앞으로 그 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는 오늘 집회를 해 보고 난 뒤 판단하기로 하고 말이다. 어쨌든 오늘은 큰 목소리를 외치며 규탄이나 항의를 하기보다는, 군중을 선동하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기 보다는 평화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 죽어간 이라크 땅 사람들에게 참회하는 것, 거기에 의미를 두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찾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약속한 시간 오후 다섯 시 삼십 분. 이곳 요르단은 어제부터 썸머 타임이 적용되고 있어 다섯 시 삼십 분이어도 날은 무척 밝았다. 우리 팀 가운데 세 사람이 먼저 떠났고, 그 팀원 셋이 닿았을 때는 벌써 일본인,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승려 네 분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청년 로드리고와 그 밖의 평화활동가, 그리고 외신 언론들이 모여 있었다. 나머지 팀원들은 더 필요한 준비물을 챙기느라 조금 늦은 때. 먼저 그곳에 모인 사람들부터 둥글게 동그라미를 이루어 숨을 쉬듯 나직이 ‘평~화~, 평~화~’를 노래했다. 마치 공원처럼 사람들이 오가는 로마 극장 가운데 평화 활동가들 둘레에는 금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곳이 공원 같은 곳이었기 때문인지 우리가 걱정했던 경찰의 제지는 따로 없었다.
사실 나를 비롯한 우리 팀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 때 아직 로마 극장에 가 있지 못했다. 몇 가지 피켓을 더 만들었고, 촛불 시위를 위한 초와 컵을 마련하고, 사람들을 챙기느라 출발이 더뎠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둘러 그곳에 닿았을 때 먼저 가 있는 우리 팀원 셋과 낯익은 외국의 평화활동가들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노래를 부르는 중이었다. 네 분이 같이 움직이는 승려 분들이 지은 노래 ‘어린이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말은’이라는 노래였다. 한 번은 광장에 모두 누워 노래를 불렀고, 그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동그라미를 이루며 선 채로 부르는 중이었다.
늦게 간 우리가 공원 기둥에 ‘어린이와 평화’ 포스터 몇을 붙이고, 피켓을 꺼내어 드니 역시 사람들이 둘러쌌다. 지난 밤 하운이가 밤을 새워 낡은 스웨터 조각으로 만든 피켓을 한 어린이에게 들려주었다. 최병수 선생님이 그린 메두사 부시 그림으로 만든 피켓을 또 다른 어린이에게 들려주었다. 혜란이가 공들여 예쁘게 만든 피켓을 그 옆에 선 청년에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한국군 파병 반대’를 쓴 피켓도 ‘전쟁 반대’를 쓴 피켓도 그 자리에 선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사람들이 너무 에워싸는 바람에 먼저 와 있는 평화팀 사람들이 손잡고 노래부르는 자리로 들어가기가 어려웠다. 우리 평화팀, 외국의 평화 활동가들, 그리고 시민들이 만든 동그라미 뒤에는 몇 겹의 사람들이 빼곡 모여 서 있었다. 게다가 커다란 카메라를 들이미는 방송국 사람들에 바쁘게 셔터를 눌러대는 신문기자들까지.
북을 힘껏 둥, 둥 치니까 그제서야 길이 조금 열렸다. 사람들이 틈을 열어주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안쪽에 모여선 우리 팀 사람들도 북 소리를 듣고서야 우리가 온 줄을 알았는지 어서 오라 손짓했다. 사실 벌써 준비한 내용은 다 한 뒤여서 무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면서 바로 북을 치며 놀면 좋겠다는 거였다. 먼저 이곳 사람들의 시위 때 들은 구호 소리를 떠올려 그 비슷한 장단을 맞추어 보았다. 덩덩 덩덩 더덩덩 덩덩덩! (노워 노워 노워 어겐스트 부시!) 마치 우리 나라의 시위 구호가 거의 네 박자로 맞추는 것처럼 이 나라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바로 삼채 장단으로 기차놀이를 하듯 공원 안 길놀이를 했다. 처음에는 내가 혼자 북을 치고 나가니까 다들 가만히 서서 무얼 하나 구경만 했는데, 기차를 만들라고 make a train 하고 손짓을 하니 조금씩 긴 꼬리가 이어졌다. 따라 오는 꼬리 행렬에서는 노워, 예스 피쓰! 가 자연스레 한 목소리로 모아졌다.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다시 동그라미를 만들어 정리를 하고, 초를 나눠주어 불을 붙였다. 즐거웠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니 즐거웠다. 아이들이 내내 따라 다니니 즐거웠다. 처음 이 집회를 계획할 때에는 아주 소박하게 초에 불을 켜고, 기도하듯 노래를 부르는 것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즐겁고,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가 되었다.
정리를 해도 사람들은 돌아갈 줄 모르고, 여기저기에서 나온 취재진들은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느라 바빴고, 사람들은 사진을 찍었다. 그런 동안 나는 한 아이와 사귀었는데 이름은 ‘알리’. 약간 정신지체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대인기피 같은 자폐증상이 있는 아이인지 좀 남다른 아이였다. 첫 눈에 볼 때에도 장애가 있는 아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 눈빛이 아주 예뻐서 샬룸, 앗쌀라무 알라이꿈 하고 인사를 건네었다. 그랬더니 아이가 기겁을 하며 엄마에게 달아났다. 그 애 엄마 또한 아주 누추한 옷차림이었다. 그 애 엄마가 무어라 아랍말로 하는데 아마 괜찮아, 예쁘다고 그러는 거야 정도의 말이지 않았을까 싶다. 아무튼 그 애 엄마가 달래듯 몇 번을 그렇게 말하니 그 애가 조금씩 내게 눈빛을 맞추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었다. …… 나중에는 알리가 볼에 입을 맞추어 주었고, 제 볼을 내게 내밀기도 했다. 알리는 내가 내려놓은 북을 쳐보고 싶어 했다. 아주 잘 쳤다. ……
로마 극장에 모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돌아오는 시간은 꽤 길었다. 함께 손을 잡고 초에 불을 붙인 사람들도, 우리를 따라다니던 아이들도 모두 아쉬워했다. 하지만 아마 가장 아쉬워한 건 우리 팀원들이었을 것이다. 이제 오늘 첫 집회를 하며 이곳 분위기를 알았으니 내일부터는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겠다. 집회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사람들과 무엇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채 걱정만 하던 게 말끔히 씻어졌다.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만나자고 했다. 알리에게도 다시 만나자고 했다. 그래서 평화의 초를 날마다 밝히자고 …….
2003. 3. 29.
박기범(이라크반전평화팀)
저작권자 © 광명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