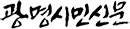[죽변]안녕
1. 죽변.
한국에 오면서부터 죽변 간다고, 죽변 갈거라고 참 많이 찡찡대었는데
이제야.
바다, 달, 파도, 갈매기, 짠내, 멀리 보이는 배.
집에 왔어요. 버려두고 간지 석달이 다 되어 가는데
혼자 잘 있었니, 미안했어 그렇게 혼자 두어서.
물어보네, 잘 갔다 왔냐고.
-응, 잘 갔다 왔어.
-어디에 갔다 왔는데?.
-응, 어디 이상한 데에 갔다 왔어.
-이상한 데?
-어, 이상한 데.
.
.
2. 집.
밤에 들어가느라 그랬을 거예요. 무서웠어요. 집 둘레에는
사람 손 닿지 않아서 풀이 얼마나 자랐는지,
꼭 귀신, 귀신이 아니면 뱀이라도 나올 것 같은 모양.
흉가, 폐가 그런 거.
정말 무서웠어.
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휴우. 야반도주하는 것처럼 급하게 짐을 챙겨
떠난 흔적이 그대로 있어.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겨울에 먹던
귤이 그사이 술이 되었는지 알싸한 냄새를 풍기면서 있는 거야.
부엌 개수대에도 거미 한 마리 제 집 만들어 놓고 있네.
아니, 거기 말고도 또 텔레비전 안테나에, 책꽂이 사이에,
늘 펴 놓는 상 다리 둘레에 아주 거미들이 잔치 잔치를 벌이고 있네.
집 안은 온통 뭔가 습한 기운에 축축하고 이상한 느낌.
심란해라.
집에 전화라도 하려고 수화기를 들어보니까 이상한 소리만 나는 게
걸리지가 않아. 아 무서라, 무서.
무서서 테레비라도 켜려 했더니 것도 나오지가 않아.
지붕에 세운 안테나가 넘어졌나봐.
어젯밤은 정말 무서웠어.
.
.
3. 아침.
아침이 되었어요. 오늘 아침.
환해지니까 이제 무섭지 않아.
눅눅한 이불을 걷어 기어 나오니까 마루에서 무엔가 삐삐 소리를 내내.
보일러가 기름이 없다고. 푸우.
뜨거운 것 좀 돌려주려 했더니, 으그.
오늘 오전까지 지원연대로 메일을 써 보내기로 했는데
집 둘레를 보니 도무지 심란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낫을 들고 나갔어요.
하필이면 니들은 왜 문간까지 와서 뿌리를 내렸니?
한참 풀을 베고 있으려니 아, 할머니.
저기 건넛집 할머니가 호맹이 하나 들고 곁에 와 앉아요.
-어데 갔다 왔노?
-어, 저기, 저 외국에요, 다른 나라에 좀 갔다 왔어요.
너무 갑자기 가게 되어서 인사도 못드리고...헤이이.
-안다, 내도 다 안다. 테레비에 나오대?
-으응, 그거 봤어요?
-봤지, 다 봤지. 거 엄한 데는 먼다고 가노?
-헤이이.
.
.
4. 바다.
보고 싶다 하는 말처럼 사무치는 게 또 있을까?
보고 싶다 하는 것처럼 슬프고, 외로우면서 또 기다려지고, 일으켜지게 하는 마음이 또 있을까?
바다가 좋은 건, 바다에 서면 보고 싶은 게 다 보인다는 거다.
아, 보고 싶다.
여기는 바다에요, 죽변 우리 집.
좀 있다 깜비에게 가요.
가서 얘기해 주게.
나 잘 갔다 왔어.
안녕.
저작권자 © 광명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