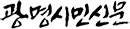爾時에 須菩提가 聞說是經하고 深解義趣하여 涕淚悲泣하며 而白佛言하기를 希有로다. 世尊이시여 佛說如是甚深經典하시오니 我從昔來所得慧眼으로는 未曾得聞如是之經이로소이다.
(그 때에 수보리가 이 경[經] 설하심을 듣고는 뜻을 깊이 깨달아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여쭙기를, 드문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처럼 매우 깊은 경전을 설해주시오니 제가 일찍이 얻은 바 혜안[慧眼]으로는 그와 같은 경[經]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경(經)의 세계는 무한히 넓다. 그런데 그 ‘넓이’에 미치는 길은 옆으로[橫]가 아니라 아래·위로[從]에 있다. 물결처럼 옆으로 밀려서 가장자리 끝까지 나아가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거나 높이 올라감으로써 ‘넓이’의 끝에 이르는 것이다.
성경을 읽든 불경(佛經)을 읽든,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읽는 것을 주(主)로 삼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진리를 깨달아 가는 길은 깊을수록 넓어진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남’을 받아들이는 품이 넓지 못하다면, 열심히 굴을 파기는 했으나 중심을 향해 파지 않고 지평(地平)을 따라서 팠기 때문이다. 그런 굴은 두더지 굴이지 진리를 캐는 굴이 아니다. 진리는 언제나 중심(中心)에 있다. 중심을 향하는 길은 깊이 들어가는 길이다. 다른 길이 없다.
깊이 들어갈수록 ‘남’을 받아들이는 품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가 무너지면서 ‘남’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나와 너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것이 없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다.
수보리가 드디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는, 그 뜻을 깊이 깨닫는다[深解義趣]. 그 결과, 슬픈 눈물이 흐른다. 그의 머리[知]가 아니라 가슴[感]이 법(法)에 공명(共鳴)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제가 일찍이 얻은 바 혜안으로는 그와 같은 경(經)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은, 부처님이 다른 종류의 경(經)을 들려주셨다는 뜻이라기보다, 수보리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났음을 고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진공무상(眞空無相)의 법이야 어디 간들 달라지겠는가? 다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의 눈과 귀에 변화가 있을 따름이다.
世尊이시여 若復有人이 得聞是經하여 信心淸淨이면 卽生實相하리니 當知是人이 成就第一希有功德이오나 世尊이시여 是實相者는 卽是非相이니 是故로 如來가 說名實相이니이라.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이 이 경[經]을 듣고 그 믿는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곧 참된 상[相]을 내리니 그 사람이 가장 드문 공덕을 이룬 것은 마땅히 알겠습니다만, 세존이시여, 그 참된 상[相]이라는 것이 곧 상[相]이 아닌 까닭에 여래께서는 이름[名]인 참된 상[相]을 설하셨습니다.)
믿는 마음[信心]이 깨끗하고 맑다! 아무 꿍꿍이속 없이, 무슨 티끌같은 욕심도 없이, 기대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믿는다.
믿는다는 말은 상대에게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긴다는 말이다. 그의 말을 곧이 듣고 그대로 응(應)하는 것이다. 나를 상대에게 흡수통일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以前)의 ‘나’는 없다.
경(經)을 믿어서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은 그의 삶이 곧 경(經)의 실현이다. 바울로의 고백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갈 2:20)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의 모습이 곧 참된 (사람의) 모습[實相]이다.
그러나, 그 참 모습을 어디에 별개로 존재하는 한 모습으로 여긴다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없기 때문이다. 참모습[實相]은 모습이 아니다[非相]. 물결에는 모양이 있고 크기도 있지만 물에는 그런 것이 없다. ‘李 아무개’한테는 무게도 있고 키도 있고 색깔도 있지만(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한테는 그런 것이 없다.
물결이 물이듯이 李 아무개는 사람이다. 李 아무개가 ‘사람’한테 자신을 흡수통일시켜 더 이상 李 아무개로 행세하지 않고 사람으로 행세한다면, 그에게서 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겠지만 그렇게 드러나 보이는 참 사람의 모습도 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물건도 어디 따로 존재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실상(實相)은 상(相)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실상이라는 것이 곧 상(相) 아님[非相]을 이르신 것이다. 그것은 마치 큰 허공 같아서 한가지 형상(形相)도 지니지 않는다. 참으로 실상을 깨달았다면 실상에 집착할 수 없는 것이다. ‘저 건너 언덕 또한 여의고자 한다’는 부대사(傅大士) 말씀대로, 다만 실상(實相)이라고 짐짓 이름지어 부르는 것일 뿐 그것을 얻어서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顔丙).
천당 가려고, 사람 되려고, 깨끗해지려고…… 예수 믿고 하느님 믿고 성경 믿고 부처님 믿는 것은 아직 멀었다. 그런 마음(… 하려는, 되려는)이 모두 없어져야 비로소 믿는 마음[信心]이기 때문이다. 맑고 깨끗하지 않은 마음은 믿는 마음이 아니다.
사람이 李 아무개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거기 무슨 목적이, 의도가, 따로 섞일 일인가?
世尊이시여 我今得聞如是經典하여 信解受持는 不足爲難이오나 若當來世後五百歲에 基有衆生이 得聞是經하여 信解受持면 是人卽爲第一希有니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와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알고 받아들이고 지니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만 훗날 5백세[歲] 뒤에 어느 중생이 있어 이 경을 듣고서 믿고 알고 받아들이고 지닌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드문 사람이 되겠습니다.)
경전(經典)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는, 듣고 믿고 알고 받아들이고 몸에 지니는 것이다. 들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앎으로, 앎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됨에서 삶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경(經)과 내가 온전한 흡수통일을 이룬다. 경(經)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경 안에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 분이 설(說)하시는 경(經)을 듣고 이런 과정을 밟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겠으나,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런 믿음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아주 드문 사람이겠다는 얘기다. 수보리로서는 언제든지 가져볼 수 있는 생각이다.
적도권(赤道圈)이 뜨겁고 극지방(極地方)이 추운 것은 태양이 가깝고 멀기 때문이다. 시공(時空) 안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거리’의 작용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세(末世)에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고 하셨다.
何以故오, 此人이 無我相하고 無人相하고 無衆生相하고 無壽者相함이니, 所以者는 何오, 我相卽是非相이요 人相衆生相壽者相卽是非相이니이다. 何以故오, 離一切諸相이 卽名諸佛이니이다.
(어째서 그러한가 하면, 그 사람에게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이 없기 때문이니 이는 아상이 곧 상[相] 아닌 것이요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상[相]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은 일체 모든 상[相]을 여읜 분을 이름하여 모든 부처님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경(經)을 듣고 믿고 알고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경을 살아가는 사람은 네 가지 상[四相]을 여읜 사람이다.
아상(我相)은 너와 다른 ‘나’가 따로 있다는 것이요 인상(人相)은 식물이나 짐승, 벌레 따위와 다른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요 중생상(衆生相)은 무생물과 다른 ‘생물’이 따로 있다는 것이요 수자상(壽者相)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수명(壽命)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것이다(티크 나트 한).
네 가지 상[四相]은 분별심의 열매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분별심을 키운다. 불보살(佛菩薩)은 이 순환고리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일체제상(一切諸相)을 여읜 분을 이름하여 제불(諸佛)이라고 한 것은, 실상(實相)을 깨친 사람은 다른 아무 것에도 견주어질 수 없으니 그 사람이야말로 두 가장자리[二變]에 붙잡히지 않으면서 중도(中道)에 처(處)하지도 않아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니 이름하여 부처님이라고 한다는 것을 마땅히 알라는 말이다”(李文會).
佛이 告須菩提하기를 如是如是로다. 若復有人이 聞說是經하고 不驚不布不畏면 當知어다. 是人은 甚爲希有니 何以故오, 須菩提여. 如來가 說第一波羅密卽非第一波羅密이요 是名第一波羅密이니라. 須菩提여, 忍辱波羅密도 如來가 說非忍辱波羅密이요 是名忍辱波羅密이니라.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기를, 그러하다, 그러하다.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經]을 듣고서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아주 드문 사람인 줄 마땅히 알아라. 어째서 그러한가? 수보리여. 여래가, 첫 번째 바라밀이 첫 번째 바라밀이 아니요 그 이름이 바라밀임을 설[說]했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욕됨을 참는 바라밀도 여래가 욕됨을 참는 바라밀이 아니요 그 이름이 욕됨을 참는 바라밀이라고 설한 것이다.)
깨달음이란 본디 나에게 있는 것을 찾는 것이다. 없던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는 발명(發明)이 아니라 발견(發見)이다.
본디 지니고 있는 것을 지니게 되었는데 놀라고 겁내고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무엇’과 아직 하나로 되지 못해서다. 그 ‘무엇’과 아직 하나로 되지 못했다면 그 ‘무엇’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다.
참으로 하느님을 믿는다면 그에게는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나 겁냄도 있을 수 없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도 물론이다.
바라밀(波羅密)은 도피안(到彼岸)이라고 번역하는데 보통 고해(苦海)를 건너 열반의 언덕에 이르는 수행방편을 가리킨다. 여섯 가지 또는 열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여섯 바라밀[六波羅密]은, 보시(布施, 자비를 널리 베품), 지계(持戒, 계율을 지킴), 인욕(忍辱, 욕됨을 참고 견딤), 정진(精進, 게으르지 않고 수행에 힘씀), 선정(禪定, 마음을 고요히 통일함), 지혜(知慧, 나쁜 생각을 버리고 참 지혜를 얻음)를 가리킨다. 여기에, 방편(方便), 원(願), 역(力), 지(智)를 보태면 열 가지 바라밀[十波羅密]이다. 사람에 따라서, 자(慈)·비(悲)·방편(方便)·불퇴(不退)를 보태기도 한다.
제일바라밀(第一波羅密)은 보시바라밀(布施波羅密)이다.
보시(布施)라는 것이,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주고 받는 물건도 모두가 공(空)이니 실(實)은 없는 것이요 그 이름만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놀라고 겁내고 두려워하겠는가? 인욕(忍辱)도 마찬가지다. 욕을 주는 자도 받는 자도 따로 없고 그놈이 그놈인데 누가 무엇을 참고 견딘단 말인가?
그래도, 주고 받음을 통하여 주고 받음이 없는 경지로 가고 욕됨을 참고 견딤으로서 욕됨을 참고 견딤이 없는 경지로 간다.
수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가볍게 처신하지 말 것이다.
何以故오, 須菩提여. 如我昔爲歌利王하여 割截身體하였거늘 我於爾時에 無我相無人相無衆生相無壽者相이니라.
(어째서 그러한가? 수보리여. 옛적에 내가 가리왕을 위하여 몸을 베어주었는데 그 때 나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던 것과 같다.)
가리왕(歌利王)은 산스크릿어로서 무도극악(無道極惡)한 임금이라는 뜻이다. 석가세존이 과거에 인욕선인(忍辱仙人)으로 수행할 때 그의 팔 다리를 끊었다고 한다. 지금 세존은 자기의 몸을 그가 자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를 위하여 몸을 베어주었다고 말한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네 가지 상[四相]을 여의었기 때문이다.
何以故오, 我於往昔節節支解時에 若有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이면 應生嗔恨이니라. 須菩提여, 又念過去於五百世에 作忍辱仙人하니 於爾所世에 無我相하고 無人相하고 無衆生相하고 無壽者相하니라.
(어째서 그러한가? 내가 옛적 마디 마디 몸을 베일 때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마땅히 성을 내고 한을 품었을 것이다. 수보리여. 또한 지난 날 5백세[歲]에 인욕선인 노릇을 할 적을 생각해보니 그 때에 나에게는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었다.)
이 몸이 ‘나’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으면 몸을 베어 줄 리도 없겠지만 마지 못해 베임을 당할 경우 성을 내고 한을 품었을 것이다.
내가 화를 내는 까닭은 내가 다칠까봐 두려워서다. ‘나’가 단단할수록 화를 잘 낸다.
“나에게 몸이 없다면 어떻게 병을 앓겠는가?”(노자).
암(癌)이나 결핵이 병이 아니다. 독립된 나[個我]가 따로 있다는 미숙한 의식(意識)이 병이다.
칼로 물을 끊고
불로 빛을 불어 끄려느냐?
밝음이 오면 어둠이 가시느니
거리낄 일이 없도다.
가리왕아, 가리왕아.
먼 인연의 물결에
달리 좋은 상량(商量, 헤아림) 있음을
뉘 알았으리오?(川禪師)
是故로 須菩提여. 菩薩은 應離一切相하고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이니 不應住色生心하고 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하며 應生無所住心이니라. 若心有住면 卽爲非住니라.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모든 상[相]을 떠나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어야 하니, 모양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소리, 냄새, 맛, 느낌, 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머무는 게 아니다.)
큰 집에 살면서 비싼 가구 쓰기를 좋아함은 모양[色]에 사로잡혀 마음을 쓰는 것이요 작은 집에서 싸구려 가구를 고집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모양에 붙잡혀 마음을 쓰는 것이다.
보살은 모든 상(相)을 떠나 위없이 높은 지혜를 얻고자 마음을 낸 사람이니 모양,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 붙잡혀서는 안 된다.
기독교인이 하느님께 붙잡힌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것에도 붙잡히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 ‘아무’속에는 물론 ‘하느님’도 포함된다. “하느님과 나 사이에 하느님도 없기를 나를 바란다”(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시방(十方)의 여러 부처님들 공양(供養)하는 것이 무심도인(無心道人) 한 사람 공양하느니만 못하다. 왜냐하면 무심(無心)이기 때문이다. 무심(無心)은 여여(如如)의 몸[體]이다. 안으로는 나무나 돌처럼 흔들리지도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밖으로는 허공처럼 막히지도 엉키지도 아니하니 이를 이름하여 부처라 한다. …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머무는 게 아니라는 말은, 진여(眞如)의 마음은 본디 머무는 데가 없는지라 이런 저런 법상(法相)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곧 도(道)와 더불어 서로 응(應)하는 것이요, 법에 머무르면 이는 바른 가르침[正敎]을 어기는 것이다. 바른 가르침을 어겼으면 이는 머물러야 할 바에 머물지 않은 것이다”(黃壁禪師).
부자로 살기를 고집하는 것이나 가난하게 살기로 고집하는 것이나 마음이 어디에 붙잡혀 있기는 마찬가지다. 자유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바울로는 “나는 부자로 살 줄도 알고 가난뱅이로 살 줄도 안다”고 했다.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에 속아서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길을 가면서도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그 사람은 수행자가 아니라 정신분열증 환자다.
요컨대,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얘기겠다.
是故로 佛說菩薩心은 不應住色라 하니라.
(그래서 부처님이 이르시기를 보살의 마음은 마땅히 모양에 머물지 않고 널리 베푼다고 하신 것이다.)
“보살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는 마음이다. 보살은 육근(六根)이 맑고 깨끗하여 어디에도 붙잡히지 않고 마음을 낸다. 어찌 그가 보시(布施)를 베푸는데 무슨 욕심을 채우려는 뜻에서 베풀겠는가? 그런데 안근(眼根. 눈)이 맑지 못한 데 온갖 고통의 뿌리가 있는지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양[눈으로 보는 것]에 머물지 말고 널리 베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陳雄).
“어리석은 자는 일을 없애고 마음을 없애지 않는다. 슬기로운 자는 마음을 없애고 일을 없애지 않는다. 보살의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리니 복덕(福德)을 짓겠다는 마음조차 없다. 여기, 버림[捨]에는 세 가지 등급[等]이 있다. 안팎으로 몸과 마음을 모두 버려 허공처럼 어디에도 탐착(貪着)하지 않게 된 뒤에 힘을 좇아[隨力] 상대에게 응하며[應物] 능소(能所, 주는 쪽과 받는 쪽)를 모두 잊으면 그것이 크게 버림[大捨]이요, 한번 도(道)를 행하여 덕(德)을 베풀되 곧 돌이켜 그것을 버리고 아무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이는 중간 버림[中捨]이요, 널리 많은 선(善)을 닦으면서 바라는 바가 있으나 법(法)을 듣고 공(空)을 알아서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이 작게 버림[小捨]이다. 크게 버림은 횃불이 앞에 있어서 미혹(迷惑)과 깨달음[悟]이 다시없는 것과 같고, 중간 버림은 횃불이 옆에 있어서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것과 같고, 작게 버림은 횃불이 뒤에 있어서 함정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黃壁禪師).
須菩提여. 菩薩이 爲利益一切衆生故로 應如是布施나 如來가 說一切諸相卽是非相이요 又說一切衆生卽非衆生이니라.
(수보리여. 보살이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자 이와 같이 널리 베푸는 것이나 여래가 설[說]하기를, 모든 상[相]이 곧 상[相] 아니라 하였고 또 설하기를, 모든 중생이 중생 아니라 하였다.)
보살이란 다만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널리 베푸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베푸는 바가 아무 것도 없다. 하되 하는 바가 없고 주되 주는 바가 없다.
“무위(無爲)의 일[事]에 처하고 말없는 가르침을 행하고 만물을 지으면서 사양하지 않고 낳되 가지지 않고 하되 기대하지 않고 공(功)을 이루고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노자(老子)의 성인(聖人)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겠다.
‘나’가 없는 사람에게 어찌 ‘내가 한 일’이 있으랴?
“보살은 법과 재물을 똑같이 베풀어 끝없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사람이니 만약에 자기가 능히 이익을 준다는 마음을 품는다면 이는 곧 법이 아니요 능히 이익을 준다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를 이름하여 머물지 아니함[無住]이라 한다. 머물지 아니함이 곧 부처님 마음[佛心]이다”(六祖).
須菩提여. 如來는 是眞語者요 實語者요 如語者요 不誑語者요 不異語者니라.
(수보리여. 여래는 참말을 하는 자요 알찬 말을 하는 자요 한결같은 말을 자요 속이는 말을 하지 않는 자요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자다.)
“참[眞]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고 알참[實]은 허(虛)하지 않은 것이고 같음[如]은 이치에 맞는 것이고 속이지 않음[不誑]은 헛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다르지 않음[不異]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한결같은 것이다. 성인(聖人)의 마음은 틀림이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그대로 수행할 일이다”(謝靈運).
속에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이 말이다. 그 말이 속 생각과 느낌에 일치되면 참말[眞語]이다. 일치되지 않으면 속이는 말[誑語]이요 다른 말[異語]이다. 예수님이 그런 것은 그렇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 하신 것은 참말을 하라는 말씀이시다. 그 밖의 말이 모두 악(惡)에서 나온 것인 까닭은 속이는 말이기 때문이다.
須菩提여. 如來가 所得法이니 此法은 無實無虛니라.
(수보리여. 여래가 법을 얻었으니 이 법은 차 있지도 않고 비어 있지도 않다.)
“차 있지 않다는 것은 법의 체(體)가 공적(空寂)하여 상(相)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덕(性德)이 있어서 그것을 쓰는데 끝이 없다. 그래서 비어 있지 않다고 한 것이다”(六祖).
“차 있음[實]을 말하고자 하면 상(相)으로 얻을 수 없고 그 비어 있음[虛]을 말하고자 하면 써도 끊이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 있으면서 있지 않고 없으면서 없지 않다. 말 가지고 미칠 수 없는 것이 다만 참된 지혜[眞智]로구나. 상(相)을 떠나서 수행하지 않으면 여기에 이를 수 없다”(李文會).
진공묘유(眞空妙有)인데, 진공에서 묘유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진공이 묘유요 묘유가 진공이라는 말이다.
사람 입이 두 개라면 동시에 한 입으로 진공(眞空)을 말하고 다른 입으로 묘유(妙有)를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입이 한 개라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일 뿐이다.
須菩提여. 若菩薩心이 住於法하여 而行布施면 如人入暗하여 卽無所見이요 若菩薩心이 不住法하여 而行布施면 如人有目하고 日光明照에 見種種色이니라.
(수보리여.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물러 널리 베풀면 사람이 어둠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고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않고 널리 베풀면 사람에게 눈이 있고 햇빛이 밝게 비추어 가지가지 모양을 다 보는 것과 같다.)
“여기 말하는 보시(布施)는, 중생을 교화(敎化)하는 법시(法施)를 뜻하는 것으로 읽는다”(王日休).
사람 눈을 뜨게 해준다면서 법에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법에 얽매여 있으면, 그것은 본인이 아직 눈을 뜨지 못한 것이므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格)이다. 둘 다 어둠에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세상을 해방시키겠다는 자여, 그대는 과연 해방되었는가? 빛이 저를 먼저 드러내지 않고서 다른 것들을 드러낼 수는 없는 법.
須菩提여. 當來之世에 若有善男子善女人이 能於此經을 受持讀誦하면 卽爲如來가 以佛智慧로 悉知是人하고 悉見是人하리니 皆得成就無量無邊功德이니라.
(수보리여. 오는 세상에서 착한 남자와 착한 여자가 이 경[經]을 받아 니지고 있으면 곧 여래가 부처님의 지혜로써 그 사람을 낱낱이 알고 그 사람을 속속들이 보리니 모두가 가없는 공덕[功德]을 이룰 것이다.)
내가 경(經)을 읽는 것은 경(經)이 나를 읽는 것이다. 경(經)은 부처님 말씀이다. 내가 경(經)을 읽으면 부처님이 나를 읽는다. 불경(佛經)이든 성경이든 경(經)을 읽으면서 본인의 실상(實相)을 보지 못한다면, 경(經)을 잘못 읽은 것이다.
자기의 실상을 읽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은 없다.
(李 아무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