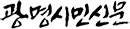학교 만들기 어려운 도시에서 학교 만들기
김현주 (구름산초등학교 대표교사)
나는 서울 토박이로 컸다. 내가 처음 학교를 다니던 때의 만리동 우리 집은 나무로 만든 한옥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큰 공사를 했는데, 환한 나뭇결을 가진 단단한 기둥이 대청마루와 댓돌 사이에 놓여졌다. 마루 안쪽 벽으로는 제비가 집을 지었고 마당은 시멘트로 발라지긴 했으나 지하수를 퍼 올려 쓰는 펌프가 있어 여름에도 얼음 같은 물을 쓸 수 있었다. 학교 가는 길에 양쪽으로 즐비하게 늘어선 한옥들과 그 길 한가운데로 쏟아져 내리던 눈부신 아침햇살은 아직도 내게 강하게 남아있다.
 그 이후로도 우리 집은 가정사의 흥망을 겪으며 많은 이사를 했다. 결혼한 지 십사년이 되는 사이에도 나는 2년에 한번 꼴로 이사를 다녔다. 대안학교일을 시작한 지 9년째로 접어드는 올해 초에는 학교터전을 옮기는 것만 다섯 번째다.
그 이후로도 우리 집은 가정사의 흥망을 겪으며 많은 이사를 했다. 결혼한 지 십사년이 되는 사이에도 나는 2년에 한번 꼴로 이사를 다녔다. 대안학교일을 시작한 지 9년째로 접어드는 올해 초에는 학교터전을 옮기는 것만 다섯 번째다.
대안학교 시작한지 9년째, 이사만 다섯 번째
사람들은 내가 옮기는 것을 좋아하는 기질이라거나 또는 ‘팔자탓’이라서 그런다고 얘기한다. 매번 이사 때마다 큰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 기회에 대청소 한번씩 하며 살림먼지 떨어내서 좋다고 생각하니 내가 이사를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데도 한 편으로는 도시 라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무언가를 일구어내야 하는 우리 시대의 한 풍속도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다.
2001년도에 처음으로 교육공간이 독립적으로 마련된 도시 속 대안학교를 시작하면서 남들처럼 시골생활이나 한적한 폐교를 인수하는 꿈을 안 꾸어본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생애 속에서 내게 주어진 공간인가를 생각하면 왠지 내 몫이 아니게 느껴진다. 내가 도시 속에서 자라나서 그런가 보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고장을 떠나서 먼 이국땅에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기도 하고, 생판 인연이 없는 곳 같은 곳에서 생활을 일구어 나가기도 한다. 내가 광명시라는 도시에 와서 이렇게 10년 가까이 대안학교일을 하며 터를 잡아갈 줄은 생각도 못한 일이다.
학교가 이사를 할 때마다, 청소를 끝내고 학교 전체를 둘러보면서 나는 매번 같은 생각을 했었다. 이 공간에서 나는 어떤 아이들과 어떤 어른들과 또 다른 만남을 일구어 나가면서 살게 될까?
공간에서 맺어지는 수많은 관계들
얼마나 많은 웃음과 눈물, 재잘거림과 침묵들이 오가는 공간으로 바꾸어질까를 그려 보면 텅 빈 공간은 어느새 사람들의 삶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의 현장이 되곤 한다. 그 공간 안에서 지어질 수많은 관계들과 이 작은 공간을 거점으로 하여 확장되어 나갈 보이지 않는 더 많은 관계들을 상상해 보는 일이 내게는 즐거운 일이다.
땅값이 비싼 도시 속에서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잦은 이사 속에서도 중심 잡고 우리를 품어주었던 부모 덕분에 나는 잘 자랐다고 자부한다. 우리 아이들도 그러리라 믿는다.
학교는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마을은 사람들이 ‘장절리’라 부르는 곳이다. 주변에 익숙한 두꺼비 생태학교도 있고 나비박물관, 샘터낚시터, 마을회관 노인정, 농협 그리고 맘씨 좋을 것 같은 슈퍼가 가깝다. 서른 명 정도의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이 조그만 이층 양옥집을 학교로 삼으며 채워지게 될 공간의 미학, 공간의 창조를 운명적으로 기대해 본다. ( 2007년 2월 8일 구름산초등학교 교사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