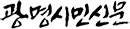- 영화 ‘밀양’을 보고...

서른 세살, 한 여자가 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 그녀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 낯선 곳에서 교통사고로 남편이 죽은 돈 많은 미망인고자 한다. 밀양이 ‘비밀스런운 햇볕(secret sunshine)'이 되길 바란다.
그러나 신애는 틀렸다. 밀양은 없다. 낯선 밀양은 그 낯섬을 이용해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신애의 유일한 생의 의미인 아들을 빼앗아간다.
눈물마저 사치인 고통을 견디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때로 어떤 유전자는 분명 무언가 부족하게 태어났음에 틀림없다. 신애는 아무런 예방주사 없이 지구에 떨어진 덜떨어진 유전자임에 틀림없다.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 속에 신애는 신을 만났다.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기도회’라면 신애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을까?
사랑하고 회계하고 용서받는 기쁨 속에 신애는 행복을 느낀다, 아니 행복을 느끼고 싶어한다.
감히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겠다는 신애의 바램은 틀렸다.
이미 회계하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범인 앞에 신애는 울부짖는다.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신이 뭔데 나보다 먼저 용서하냐?”고...
신애는 신을 비웃고자 한다.
열정적이고 진지한 기도회에서 신애는 “거짓말이야!”라는 노래를 튼다.
신애는 이번에도 틀렸다. 그 정도의 장난에 신은 끄덕도 않는다.
더구나 배짱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도둑질하듯 몰래 CD를 바꾸는 것 정도로는 어림없다.
신애를 위한 기도모임을 하는 이웃을 향해 던진 돌은 유리창 하나 깨뜨리지 못한다.
신을 받들고, 햇볕 한 조각에도 신이 깃들어서 그 삶은 행복하다고 외치는 장로의 위선을 무너뜨릴 섹스조차 성공하지 못한다.
신을 마음껏 조롱해줄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

영화는 현실의 잔혹함을 결코 따라오지 못한다. 현실은 늘 영화보다 잔인하다. 그럴 때 약해빠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 밖에 없다. 삶은 택할 수 없었지만, 운명조차 신의 장난에 놀아나지만, 죽음은 내가 선택하겠노라고...
그러나 신애는 그것조차 하지 못한다. 피 흐르는 손목을 잡고 기껏 나가서 외치는 소리는 “살려줘요”다.
영화는 아니, 신애가 묻는다. 나 어떻하죠? 더 살아야 해요?
신애와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신애와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신애에게 소주라도 한 잔 사주며 그래도 삶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 삶에는 아니, 영화 속에는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그 무엇이 존재한다.
그림자처럼 신애 옆에 있는 남자, 종찬(송강호)이 바로 그다.
바보처럼 늘 웃고, 화도 잘 내지 않는 존재..
신애에게 무시당하면서도 항상 곁에 있어주는 존재...
감독은 구원을 인간에게서 찾고 싶었을까?
병원에서 퇴원하는 신애를 맞아주는 이웃, 인터리어는 무슨..하며 비웃었는데 신애의 조언대로 인테리어를 바꾼 이웃의 모습. 신애라는 낯선 존재를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밀양’에서 구원을 찾기를 바라는 것일까?
그림자처럼 찾아다니는 무조건적인 사랑, 종찬에게서 찾으라는 걸까?
의사들은 말한다. “아무 이상 없는데요”
그러나 도저히 참을 수 없이 가슴 어딘가가 아프다. 길을 걷다가 멈추고, 하늘을 보며 눈물 짓는 고통 하나 없는 삶이 있을까?
왜? 도대체 왜? 라고 신에게 외쳐 보지 않은 삶이 있을까?

신애의 나약함이 화가 났다. 그 유아적인 광기를 비웃어주고 싶었다. 왜 그 정도 밖에 안 되냐고. 그 정도의 고통조차 없는 생(生)일줄 알았냐고 조롱해주고 싶었다.
결국은 그렇게 못했다.
피 흐르는 손목을 부여잡고 “살려줘요”외치는 신애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느꼈다.
이창동 감독은 장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을 잃지 않았고, 전도연의 연기는 빛났다.
영화 속 대사...
“밀양은 어떤 곳인가요?”
“별 다를 게 없지요. 뭐. 그저 사람 사는 데지....”
밀양에 가본 적이 있다. 오래전 여행 중 잠시 들렸던 곳이다. 내게는 그저 작고 소박한 도시처럼 느껴졌다. 나 또한 ‘밀양’을 꿈꾼다. 아무도 나를 모르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을....그러나 어디든 마찬가지일지 모른다.
결국 내가 강해져야 함을....
운명 따윈 아랑곳없이 신을 조롱하며 한판 놀다 가는 게 이 한 번의 생(生)임을 가끔 생각한다.
우리 모두에게 ‘밀양’은 바로 여기가 아닐까?
<글쓴이 정미영님은 철산3동에 거주하며 고교평준화학부모연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