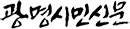14일 오전 11시 평생학습원에서 진행된 두 번째 토크콘서트(토요일의 크나큰 이야기, 토크 콘서트)는 ‘올림픽, 우리가 몰랐던 숨은 이야기’를 주제로 열렸다.
토크콘서트 무대에 오른 이들은 나름 그 바닥에서 쟁쟁한(?) 멤버들이다. 사회는 김찬호 성공회대 교수. 초대 손님은 정윤수 스포츠칼럼이스트와 박문성 에스비에스해설위원이다.
정윤수칼럼니스트는 2002년 월드컵 신화를 지켜보면서 ‘스포츠’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축구에 대한 ‘미학’을 인문학적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다양한 칼럼을 통해 선보였던 인물이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공중파 해설위원이니, 그의 말발(!)을 어찌 평가할 수 있을까. 이날 토크콘서트는 ‘토크’의 진수를 보여줬다. 배꼽을 잡을 정도로 웃겼다. 또 해박한 지식과 스포츠의 겉과 속을 파헤치는 논리와 안목은 듣기에 시간이 부족했다. ‘앵콜’을 청하고 싶다.
김찬호 교수는 “인간의 문명, 현대사회의 과학과 정치, 경제, 예술 등 모든 것이 집약돼 있는 종합판이 스포츠이다. (세상을 보는) 좋은 텍스트이다. 올림픽에 전세계가 마법에 걸린다. 전세계 스포츠 이벤트를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자”며 무대를 열었다.
이어 초대손님의 미니강의가 진행됐다.
정윤수 칼럼니스트는 스포츠가 가지는 다양한 측면을 함께 보자고 제안했다. 인류는 일과 노동의 측면 외에 놀이이자 유희로서 유구한 역사를 이어왔고, 그것이 스포츠의 한 면이라고 소개했다. 축구장에서 열광하는 관중들의 환호 속에는 그런 유희의 역사가 담겨 있다며, 스포츠를 제대로 즐길 것을 권했다.
한편 지난 20세기에는 부당한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국가주의적 스포츠의 측면이 있었고, 스포츠 산업과 미디의 측면에서 자본의 논리가 작동돼 왔다고 지적했다. 정윤수 칼럼니스트는 올림픽 메달 외에도 스포츠가 가진 다양성, 총체적 측면을 문화적 다양성과 스포츠 감수성을 통해 읽어 내자고 제안했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기자출신 해설위원으로 축구계의 돌아가는 최근 정보를 다양하게 펼쳐보여 주었다. 피파리그 중계권료에서부터 피파를 둘러싼 권력 암투를 언급했다. 그럼에도 전세계가 축구에 열광하는 데는 축구와 축구인들이 가지는 순수한 힘 때문이라며, 그 힘을 믿고 싶다고 말했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맹국이 참여하는 곳이 피파이고, 축구가 매력적인 것은 관전 스포츠가 아닌, 공 하나면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참여 스포츠’의 성격이 강해서라고 언급했다.

미니강의에 이어 대담에서는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패널들은 미디어를 통해 노출된 스포츠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경계하자고 했다. 왜 선수들의 인터뷰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인지, 선수들에게 ‘말 시키는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뒤집어 보자고 했다. 선수들은 정말 말을 못할까. 우리 선수도 외국선수들처럼 위트있게,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것이 왜 가능하지 않는 것일까. 미디어가 잘라내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왜곡되는 측면은 없을까 반문해보자고 제안한다. 충분하게 말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일까. 유소년시절부터 그런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나라는 4,5만석 이상의 축구장만 있는 것일까. 유럽처럼 7천석에서 만석 규모의 축구장을 지으면 안 되는 것일까. 그렇게 대규모로 지은 월드컵구장들이 관리비 부담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1만명 규모의 추구팬들이 국내리그를 응원하고 있음에도, 축구장이 텅빈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은 누구탓일까.
월드컵 구장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즈음에 다시 평창 동계올림픽은 천혜의 가리왕산을 헤치는 방식으로 개발되는 것은 아닐까. 천혜의 자연을 보전하면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토건개발세력과 결탁된 88올림픽의 무리한 이해와 요구의 결합이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닐까. 얼마 후 영국으로 떠나는 박문성 해설위원의 숙소는 대학 기숙사. 우리처럼 새로 짓는 것이 아닌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재활용하는 그들의 방식을 왜 우리는 따르지 않는 것일까. 혹 토건개발세력의 이해때문이라고?
그리고 선수들을 보호하고 선수들을 중심으로 하는 스포츠 시스템을 구축해가야 한다는 제안. 또한 대한건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중심의 이야기가 아닌, 스포츠 경기를 즐기는 그 자체로서 즐거움과 환희를 보자는. 숨막히는 올림픽도 좋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즐길 수는 없을까. 독립운동가로서 질주하는 우리 선수들이 아닌, 스포츠맨으로서 우리 선수들을 바라보자는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