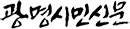김춘승 기자의 사색공감
어제는 눈이 내리고, 살을 에는 듯한 바람이 부네요. 서울 생활이 20년 가까이 되는데, 여전히 서울의 삭풍은 견디기 힘드네요.
아~ 남도의 겨울은 바람조차 따뜻한데.
며칠 전 통영의 사돈어른이 유자를 보내주셨어요.
큰 박스로 한가득 보내주셨는데 시장에서 파는 유자와는 다르게 못난이에요.
농약을 안친 여염집 거라 그런지 울퉁불퉁하고 색깔이 바랜 곳이 많더군요.
하지만 박스를 열고 밀고 나오는 향긋한 유자향,
남도의 따뜻하고 비린 바다 바람을 가득 안고 왔어요.
어머니 심부름으로 유자청을 담을 유리그릇을 사러 바깥에 다녀왔어요.
집으로 가는 계단이 통영의 노오란 유자밭입니다.
이제는 노동의 시간입니다.
고향에서는 겨울 김장과 더불어 유자청을 만드는 것이 겨울 채비입니다.
유자 꼭지를 숟가락으로 땁니다. 꼭지를 유자청에 넣으면 맛이 씁니다.
유자 껍질을 엄지손가락으로 까서 알맹이를 껍질에서 분리합니다.
이제는 어머니만의 노동입니다.
유자 껍질을 두세 겹 겹쳐서 채를 썹니다.
밥장사를 오랫동안 하셔서 어깨가 성치 않습니다.
고된 칼질로 내일 또 앓아누울 실겁니다.
노오란 몸을 덜어낸 유자 껍질과 하얀 백설탕을 스뎅 대야에 붓습니다.
알맹이를 빠알간 플라스틱 체에 짓이겨 체액만 사용합니다.
이젠 맨손으로 유자 껍질 채, 체액 그리고 백설탕을 버무립니다.
손이 쓰라립니다.
처음 인사하는 사이처럼 뻑뻑하지만 점점 서로에게 아픔을 허락하고, 걸쭉하게 섞입니다.
손은 유자 속껍질처럼 하얀 색으로 물듭니다.
물든 유자청이 내 체액에도 흐릅니다.
겨울의 삭풍도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늦게 온 소포> 고두현
밤에 온 소포를 받고 문 닫지 못한다
서투른 글씨로 동여맨 겹겹의 매듭마다
주름진 손마디 한데 묶여 도착한
어머님 겨울 안부, 남쪽 섬 먼길을 해풍도 마르지 않고 바삐 왔구나
...
큰 집 뒤따메 올 유자가 잘 됐다고 몃 개 따서
너어 보내니 춥울 때 다려 먹거라
고생 만앗지야
봄 볕치 풀리믄 또 조흔 일도 안 잇것나. 사람이
다 지 아래를 보고 사는 거라 어렵더라도 참고
반다시 몸만 성키 추스리라
...
저작권자 © 광명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