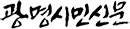며칠 남지 않은 봄방학, 아이들은 학교에 없지만 교사들은 마음이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새 교육과정을 짜고 새로 만날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준비 중의 하나는 작년에 만난 아이들과 이별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작년 우리 아이들은 누구에게 부탁해야 우리가 계속 같이 살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답했다.
‘선생님 우리 이대로 평생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던 아이들이
‘교장선생님을 만나야 하나요? 대통령을 찾아가야 하나요?’
그러자 한 아이가
‘우리 엄마는 부장선생님이라 맘대로 다 할 수 있는데’라고 말했다.
아이들이 그 아이에게 집중하며
‘너희 엄마한테 말해 그럼’
그러자 그 아이가 당황해했다.
‘근데 우리 엄마가 중학교에 있어서 그 학교에서만 맘대로 할 수 있어’
아이들이 이내 실망한다.
결국 아이들은 헤어지는 마지막 날 내 품에 안겨 울었다.

학교는 해마다 만나고 헤어지는 일을 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다. 그 이별의 단위는 시간과 공간과 사람을 포함한다. 그러나 아이들의 마음이나 불안, 슬픔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별을 밥 먹듯 하고 난 아이들은 몇 해가 지나면 이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는다. 이별에 의미가 사라진다는 건 만남에도 의미가 사라지는 일과 같다. 만남과 이별에 의미가 사라진다는 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다. 아이들이 마른 감정으로 딱딱한 책걸상을 마주하고 앉아있는 장면은 상상만으로도 상막하다.
당연히 오래 보지 않을 사람, 일 년만 견디면 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진정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교사도 아이들도 학부모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매년 학기 초 모두가 같은 신 학년 스트레스를 반복하며 우리는 서로를 탐색하고 익숙해지는데 드는 에너지를 교육에서 탕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일을 반복한 아이들은 다시 만나는 친구들을 풍경처럼 대한다. 그리고 텅 빈 그 마음은 아이들에게 집요하게 강요되는 과목에 대한 부담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지도 모른다. 존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공부스트레스가 친구나 선생님에 대한 관심대신 가득할지 모른다.
교사들은 일 년을 같이할 새 동료들과 개인적 얘기할 시간도 없이 업무와 교육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힘든 일은 서로 탁구공처럼 튕겨내며 치열한 조율을 끝낸 학교, 늘 사람이 가까워지는 것은 한쪽으로 미뤄두며 시간 날 때 하는 것으로 되어 버린지 오래다. 그래서 서로 익숙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일들은 삐그덕 마음에 빗장을 채우기도 한다. 이렇게 교사들은 새 학년에 풀어놓을 보따리를 싸고 있고 아이들은 새 학년 공부 준비를 하고 있는 2월이다. 일 년 동안 사용하던 물건들을 새로 배정된 교실로 옮기는 이사도 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짐을 싸고 이사하는 일로 몸살이 나기도 한다.
나는 잦은 이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은 인위적 만남들에 몹시 지쳐 감을 느낀다. 이렇듯 종소리 나면 책을 덮는 수업시간처럼, 일 년의 단위로 만나고 헤어지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은 누구나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다. 학기의 시스템과 똑같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내면의 저항 같은 것이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람을 향해 마음의 빗장을 채우지 않으려는, 마음의 본연 같은 고향을 지키려는 것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