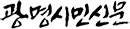수민이의 발칙한 유럽여행기
* 5월 6일 런던 [캠든 록 마켓]
에든버러를 뒤로하고 다시 런던으로 내려온 그날 아침. 우리는 캠든록 마켓에 갔다. 우리나라의 일요시장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옷가게, 악세사리, 음식점들이 줄줄이 늘어져 있고, 사람들도 바글바글 했다. 이곳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옷 입는 스타일도 갖가지다.
무엇보다 이곳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길거리 음식이라던가, 뭔가 서민적인.......이들이 사는 문화를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길거리 음식 분식처럼 서서 먹기도 하고, 이들이 즐겨먹는 음식들도 맛보고 싶었다.
캠든록 마켓은 내 상상과 똑같았다. 오히려 그것 이상이었다. 특이한 소품들, 특이한 옷들, 펑크족들과, 특이한 음식들, 그리고 특이한 사람들까지. 너무 즐거웠다. 여기서 또 하나 느낀 것은 사람 사는 게 다 비슷비슷 한 것 같다는 것이다. 이곳에도 1파운드 마켓도 있고, (천원시장과 같은.......) 세일하면 아줌마들 몰려들고, 그런 비슷한 일상들도 있다. 다른 차이점들도 많지만 그걸 알아가는 것이 즐겁고, 우리와 다른 이들만의 뭔가를 점점 찾게 된다. 색다른 것 들을........
▲ 캠든 록 마켓
6일 저녁. 우리는 영국을 떠난다. 버스를 타고, 배를 타고 도버해협을 건너서 프랑스로......... 약 일주일동안 내가 봤던 영국은 소문대로 정말 신사적이고, 매너 좋은 나라였다.
교통수단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사람이 최우선인 그곳에선 신호에 상관없이 먼저 양보 해주는 게 습관인 듯 했다. 그리고 이들은 아침마다 늘 바쁘게 움직였고, 시간에 대한 낭비가 없는 듯 했다. 영국을 첫 번째 나라로 선택하고 간 것은 영어, 그리고 도버해협 을 건너야하기 때문도 있지만, 시간관념이 잘 박힌 영국 사람들을 보면서 여행초반에 우리도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바도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 만큼은 그 분위기에 휩쓸려 늦잠도자지 않았다. 늘 아침 8시에 일어났고, 그 시간에 창밖을 내다보면 영국 사람들은 늘 활기차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2. in 프랑스
5월 7일 [레스토랑에서 밥 먹기]
간밤에 타고 온 유로라인(유럽통용 버스)의 피곤함을 들쳐 업고, 나와 친구는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다. 그 크고 럭셔리한 파리에 감격할 새도 없이 치룬 일이 하나있다.
그것은 바로 레스토랑 가기! 물가가 비싼 영국에서는 꿈만 꿨던 그, 레스토랑! 감히 차가운 샌드위치만 먹던 입으로 말하기도 거북해 앞글자인 '레'만 입 밖으로 발설할 수 있었던 그, 레!.......허나, 요리! 하면 프랑스를 먼저 생각할 만큼이나 엄청난 음식문화를 지닌 이곳에서 레스토랑 한번 못 간다는 것은 죄악이며 이들의 문화를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생각했다.)
▲ 프랑스. 바게트 샌드위치 시식하기.
게다가 레스토랑도 각양각색이라 유명한 음식이며, 가격이며 우리나라의 음식점과 별 다를 바는 없었다. (음식점 보단 고급스러웠지만.)해서 가격부담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레스토랑이 좋고, 어느 곳이 싼지 모르니.......가이드북에서 추천한 싸고, 맛있는, (또 인기 좋은!)곳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그게 말은 쉽지. 밤새~도록 유로라인의 의자 때문에 잠 한숨 못 자고, 이 큰 파리 시내에 도착 하자마자 트렁크 끌고 레스토랑을 찾기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말 고난이었던 것은 못 씻은 얼굴과, 입안의 찝찝함보다도 말이 안 통하는 프랑스 사람들 때문. 프랑스 사람들의 자국적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시니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영어를 쓰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빨리 레스토랑에서 고픈 배를 해결하고, 숙소에 들어가 쉬고 싶었다. 영어로 물어봐도 다~ 알아들으면서 대답은 프랑스어로 해주시니 원. 정말 배고프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짜증이 치밀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옆 나라인 일본에 대해 의식하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듯이,(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프랑스 어르신들도 옆 나라인 영국에 대해 그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영어를 싫어하는 어르신들도 꾀 많은 듯 했다. 그날따라 젊은 사람들은 또 왜 그리 없었는지....... 괜히 프랑스 젊은이들만 원망스러웠다. (프랑스 젊은이들 잘생겼다면서 얼굴도 안보여주고 말이야! 응!?)
아마도.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옆 나라인 일본에 대해 의식하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듯이,(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프랑스 어르신들도 옆 나라인 영국에 대해 그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영어를 싫어하는 어르신들도 꾀 많은 듯 했다. 그날따라 젊은 사람들은 또 왜 그리 없었는지....... 괜히 프랑스 젊은이들만 원망스러웠다. (프랑스 젊은이들 잘생겼다면서 얼굴도 안보여주고 말이야! 응!?)
그렇게 거의 3시간을 넘게 이리저리 해매이다 찾은 레스토랑은 마치 수십 년간 떨어져있다 죽기 전에 만난 부인만큼이나 반가웠다. 괜히 눈물도 나고, “아이고, 왜 이제야 나타나셨소!”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 생긴 것 같았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꼴이 마치 거지마냥 꼬질꼬질한 모습이었던 것. 레스토랑엔 품위와 격식을 좀 더 갖추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게 매너라고....... 우리 눈엔 당장이라도 저 앞에 레스토랑 매니저가“손님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았다.
어쩌지, 트렁크에서 원피스라도 꺼내 입어야하나. 그러고 보니 트렁크도 질질 끌고 다니고 있었다. 덤으로 때가 탄 담요까지 덮어쓰고, 마치 아랍계 애들처럼. (5월 초였는데 날씨는 아직 쌀쌀했기 때문에.)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어찌 하겠어, 배는 이미 등가죽에 붙은 지 오래고, 바로 앞에서 냄새가 솔솔 풍겨오는데.......
우리는 트렁크를 끌고 그대로 돌진하듯 들어갔다. 우리의 무기는 국제적 귀여움이다!?라며. 어리숙한 프랑스어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먹었다. 무슨 음식인지도 몰랐다. 급해서 영어 메뉴판 가져다 달라는 얘기도 못하고, 코스요리 아무거나 찍어서 먹었다. 무슨 요리인지 몰라서 더 즐거웠다. 뭐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상한 게 나올지도 모르는 스릴감(?). 만약 입맛에 안 맡는 음식이 나오더라도 음식문화체험이려니 하고 넘길 수 있었다. 특이한 음식도 나왔지만, 역시 메인인 스테이크가 최고였다! 그 순간이야 말로 정말 너무 행복한 순간.
지금 생각해도 에펠탑을 봤을 때 보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봤을 때보다도 더 감격스러웠던 것 같다. 어느 나라 음식을 먹든 배고픈 뒤에 먹는 음식은 정말 먹는 행복감에 겨울 수밖에 없다.
정말 누구라도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트렁크를 끌며 걸어 다니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단. 아침부터 한 끼도 먹지 못 했을 때. 그리고 밤새 유로라인을 타고 내렸을 때, 먹는 음식은 더할나위 없는 감동이다.